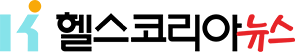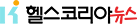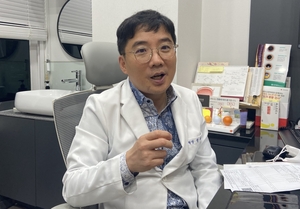서울대 의과대학 강영호 교수가 빅데이터의 소득수준을 이용한 기대여명 차이분석 및 건강형평성 지표로의 활용방안 모색 연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연구 결과, 건강보험에 가입한 소득 상위 20% 남성의 기대여명은 77세로 소득 하위 20% 남성의 기대여명(67.9세)보다 9.1년 긴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는 소득 상위 20%의 기대여명(82.6세)과 소득 하위 20%의 기대여명(78.8세)이 3.8년의 격차를 보였다. 소득수준에 따른 기대여명 격차가 남성이 여성보다 3배 가량 많은 셈이었다.
특히, 지역가입자에서 소득수준별 기대여명의 차이가 높았다. 남성 지역가입자 소득 상위 20%의 기대여명은 76.7세로 소득 하위 20% 남성의 기대여명(62.7세)보다 14년이나 차이가 났다.
이는 농촌 지역 주민, 비정규직, 차상위계층, 사회적 보호가 취약한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사망률이 높기 때문이다.
고소득 지역가입자의 기대여명은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기대여명과 유사했다.
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기대여명은 남성 55세, 여성 71.6세로 매우 낮았다.
강영호 교수는 “소득수준별 기대여명의 격차는 사회의 극명한 양극화를 반영하고 있다”며 “다만, 흡연, 음주, 운동, 비만, 혈압 등의 기전이 반영되지 않아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는 소득수준에 따른 기대여명 차이를 규명하고, 소득수준별 기대여명 차이에 기여하는 연령별, 사망원인별 기여도를 추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연구를 의뢰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일 이와 관련된 세미나를 개최해 학계 및 시민단체와 소득수준에 따른 기대여명의 차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