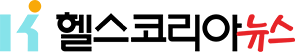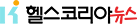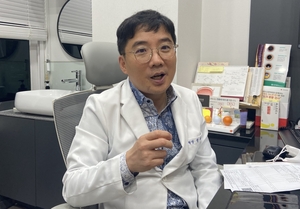평소 수줍음이 많고 말이 없으셨던 할아버지는 수술 당일, 수술실로 가기 위해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계셨다. 수술실로 향하기 위해 이동 카에 누우신 순간에도 가족들이 인사를 하는데도 대답 없이 눈만 꼭 감고 계셨다. 너무 긴장을 하신건가 싶어서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수술 잘 될 거예요.”하며 한마디 건네 보았지만 할아버지는 결국 한마디 말도 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무안하게 수술실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꼭 감긴 할아버지의 두 눈가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얼마나 두렵고 걱정스러웠으면, 눈을 꼭 감고 차마 한마디 말을 할 수 없었을까. 가족들 앞에서 눈을 떼면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을 할아버지 심정을 조금이나마 헤아리면서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손을 꼭 잡아드리는 일 뿐이란 생각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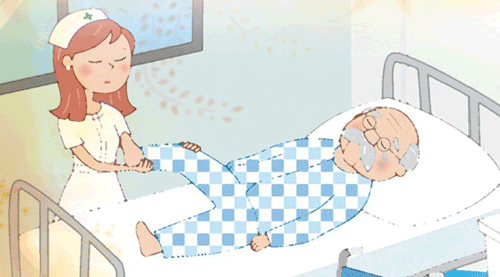
수술실로 들어서는 순간까지 할아버지는 눈을 뜨지 않으셨지만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고 얼마 뒤 멋진 중절모를 쓰시고 퇴원을 할 수 있었다.
수술 후 흉부외과 병동으로 옮긴 할아버지를 몇 차례 방문하여 안부를 물었지만, 그때마다 눈 한번 마주치지 못하고 수줍은 눈길로 대답을 대신 했던 할아버지의 모습은 나에게 가슴 뭉클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유독 만성 환자들이 많이 입원하는 병동이라 환자의 고민을 일일이 듣고 헤아리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바쁘다는 핑계로 환자들의 마음까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일하던 나에게 할아버지의 눈물은 나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픔과 고통을 함께 공감해 줄 여유가 넉넉지 못한 현실만을 탓하던 내가 조금 더 환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간호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없이 일깨워 주신 것이다. 할아버지의 눈물이 나를 질책하거나, 더 잘하란 질타를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환자와의 대화와 그 마음에 더욱 진심을 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해주었다.
그 후, 나에게는 한 가지 버릇이 생겼다. 인계 노트위에 몇 가지를 적으며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실천하려고 노력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진심을 담아 말하기, 미소 지으려 노력하기, 즐겁게 일하기, 웃기지 않아도 웃을 수 있기’ 등등 바쁜 일상 속에서 지키기 어려운 약속들이지만, 노트를 보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노력했다. 내 마음을 알아봤던 것일까? 병원을 찾았던 환자의 추천으로 친절 교직원으로 상까지 받게 되었다.
지금은 돌아가신 할아버지(3년 뒤 할아버지는 폐렴으로 사망하셨다)의 수줍은 미소가 가끔씩 뵙고 싶다. 또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할아버지 덕에 열심히 살고 있다고....... 일이 힘이 들 때마다 할아버지를 떠올리며 먼저 가신 그곳 하늘나라에서는 고통 없이 편안하길 빌어본다. [경희의료원 수술실 간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