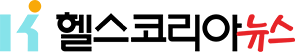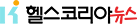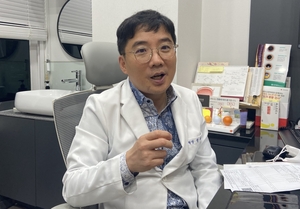[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골다공증의 급여 기준에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골다공증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인데, 골밀도를 나타내는 T값에 따라 급여가 중단될 수 있어 환자의 질환이 호전되면 치료를 중단할 위험이 있다는 것.
대한골대사학회가 3일 개최한 제33차 춘계학술대회의 '대한민국 골절 예방 2025 로드맵 정책 토론회'에서 이영균 교수(대한골대사학회의 총무이사, 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는 '골절 예방을 위한 골다공증 치료 환경 개선 방향 : 보험 급여 현황 및 중단 없는 지속 치료를 위한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현행 급여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영균 교수는 "현재 국내 골다공증 급여 기준을 살펴보면, T값이 -2.5보다 낮은 경우에만 급여 적용이 가능하고 -2.5를 초과하면 급여 적용이 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은 골다공증을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만성 질환으로 정의하고 있다. 환자의 호전에 따라 급여를 중단하게 되면 치료 중단으로 이어져 다시 골다공증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국내 급여 기준은 최소 1년 이상 골흡수 억제제를 사용한 이후에 골형성 촉진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 가이드라인과 정 반대되는 기준"이라며 "골형성 촉진제는 국제 가이드라인에서 골절초고위험군에 1차 치료제로 권고되고 있으며, 골흡수 억제제 이후 골형성 촉진제를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골밀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급여 기준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 자리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정책과 최경호 사무관은 "골다공증은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이라는 것에 동의한다"며 "특히 기준이 되는 T값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한다"고 답했다.
최 사무관은 "다만 현재 153만 명 정도의 환자가 골다공증과 관련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급여 기준의 T값을 재설정하는 등 수치를 바꾸게 되면 많은 예산이 추가적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다. 예산 순위를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