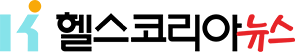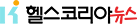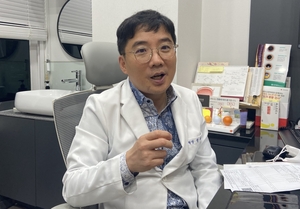[헬스코리아뉴스 / 김동석]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침상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는 낙상 사고를 당했다. 1심과 2심은 병원이 환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의료상 과실 책임을 인정했다.
그렇다면 대법원의 판단도 똑같을까?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7일 급성담낭염으로 병원에 입원해 경피적 담도배액술 및 도관 삽입술을 시행받았으나 다음 날인 8일 혈압저하, 고열, 패혈증이 발생해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병원은 A씨를 낙상위험도 고위험관리군 환자로 분리하고 위험요인 표식을 부착했다. 침대 높이도 최대한 낮추고 침대 바퀴도 고정했으며 환자 고정 안전벨트를 매는 등 낙상 방지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A씨는 침상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는 낙상사고를 당했다. 당시 간호기록을 살펴보면 간호사가 A씨의 취침 상태를 확인한 것은 새벽 3시45분. 15분 뒤 '쿵' 소리가 들려 바로 가보니 A씨가 침대난간을 넘어와 엉덩이가 바닥에 닿고 머리를 찧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당시 A씨는 수면 상태였고 사고는 새벽에 일어났다”며 병원의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을 물어, 환자의 치료비 중 공단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가 낙상 사고를 당해 뇌손상을 입은 치료비에 대해 병원 측 과실이 60%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주장한 1억 6665만원의 진료비 구상청구금 중에 999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법원은 “A씨가 어떤 경과로 침대에서 떨어졌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으나 중환자실이었고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할 정도면 더욱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가 요구됐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안전벨트를 했다면 그것을 풀고 떨어지면서 상당한 소음이 발생했을텐데 근무중이던 직원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안전예방매트가 주변에 설치되지 않는 등의 소홀함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3부는 병원 측 책임을 인정했던 원심 판결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낙상 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경과가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환자의 낙상 방지를 위해 나름의 조처를 한 병원에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라는 것에 대해 더욱 충실히 심리하고 판단했어야 하지만 당시 상황에 대한 막연한 추측으로 병원측 과실을 물은 판결을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