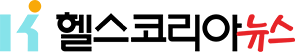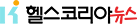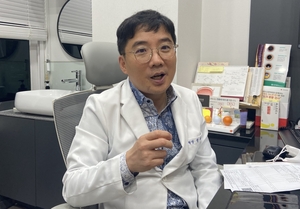지난해에 벌어졌던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원주와 제천의 의료기관이 새해 벽두부터 적발됐다. 지난해 말 서울 다나현대의원 사건이 채 석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국민들이 느낀 충격과 배신감은 더욱 커보인다.
여기에 원주의 의료기관은 주사기 재사용 때문에 집단 C형간염 감염 사태까지 벌어진 탓에 정부와 의료계가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동료 의사들이 SNS등에서 밝히는 이번 사건의 소회는 단순한 비난이 아닌 분노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한 개원의는 SNS에 ‘정말 양심적으로 행동하면 1년도 못가 (의료기관의) 문을 닫아야 한다’는 글까지 남겼다.
왜 그런 것일까. 생각해보면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논란은 비단 이번 일뿐만이 아님을 짚을 필요가 있다. 의료계는 지난 몇 년간 위내시경 생검에 사용되던 겸자(포셉, Forcep)의 세척 후 재사용 문제로 곤욕을 치렀다.
당시 세간에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내시경 검사 후 폐기해야 할 겸자를 알콜솜으로 닦는 모습, 10여회 사용이 가능한 재사용 겸자를 100회 이상 사용하는 모습이 노출됐다. 대중 언론들은 일부 의료기관이 신체에 삽입돼 타액이나 분변, 혈액 등이 묻은 겸자를 제대로 된 소독도 재사용 기준도 준수하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었다고 대서특필했다.
여기에 지난해 2월 미국의 대형병원에서 담도내시경 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집단으로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됐다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발표가 나오면서 일회용 겸자 문제는 일파만파로 커졌다.
겸자의 사례는 일회용 의료기기 논란이 언제, 어느 기기, 어느 의료기관에서 발생할지 모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겸자가 혹은 주사기가 아니더라도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논란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논란이 항상 ‘의료인의 비윤리성’이라는 수준에서 끝난다는 점이다. 같은 문제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항상 의사 개인의 문제로 인해 모든 사건이 발생했다는 논리가 쓰여진다. 과연 그런 것일까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다시 벌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책’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적정한 수가를 보상해주는 것으로 귀결된다.
일회용 겸자만 해도 의료기관들이 해당 기기를 다시 쓸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기기를 한 번만 쓰고 버리는 것이 ‘적자’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겸자의 경우, 1개당 가격은 평균 2만3000원이지만 재료비를 포함한 수가는 불과 8000원가량에 불과했다. 의료기관은 ‘정상적인’ 검사 과정을 치렀음에도 환자 1인당 15000원을 손해볼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겸자는 지난해 8월 치료재료로 인정돼 2만2000원의 정액수가를 받게 됐지만 아직 남아있는 ‘돈 버리는’ 일회용 의료기기는 곳곳에 남아있다.
동네 구멍가게도 ‘남는 장사’가 아니면 물건을 팔지 않는다. 의사도 ‘생명’이라는 숭고한 사명감이라는 허울로 경제적 불이익을 감내하기는 쉽지 않다.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한 혹은 이들을 감싸려는 의사들을 지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 문제가 단순히 부도덕함이 아닌 일을 하고서도 적자를 봐야 하는 의사들과 저비용만을 추구하는 국내 의료보험체계의 총체적 문제점이 맞물린 사건임을 눈여겨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