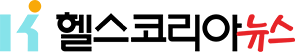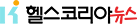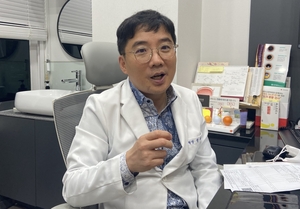만취상태로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가 귀가한 지 2시간 만에 돌연사한 것과 관련, 의료진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최근 유족 측(원고)이 추가 진단 없이 위장약만 처방해 돌려보낸 병원장과 담당 의사(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1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평소 당뇨를 앓고 있던 A씨(53)는 지난 2월 저녁 폭탄주를 마신 뒤 구토를 했고, 그 후 배가 쓰리고 따가운 증상을 느껴 새벽 1시경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그날 병원의 당직의사였던 B씨는 A씨가 술을 많이 먹어서 복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단, A씨에게 위산분비억제제를 주사하고 구토억제제와 위장약을 처방했다.
그러나 A씨는 집에 도착해서도 복통이 계속됐고, A씨의 배우자인 C씨는 피고인 B씨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부재중이어서 직접 통화를 하지 못했다.
그 후 A씨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구급대를 통해 대구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새벽 4시40분경 사망했다. 사망 사인은 유족 측에서 부검을 거부해 급성심장사로 추정된 상태다.
유족측은 “환자가 술을 먹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는 이유로 의료진은 술을 많이 먹어 속이 쓰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오진, 이에 대한 처방만 하고 호소한 복통에 대해 상세히 진찰하지 않았다”며 환자 사망의 책임을 물어 병원측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러한 원고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환자가 병원에 머물러 있던 시간은 총 8분에 불과해 검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확인하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진료기록부에도 혈압, 맥락, 호흡, 체온 등의 검사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충분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또 “급성복통은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흔하고, 잘못된 진단을 내리게 되는 경우도 많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의료진이 적절한 응급치료를 하지 못하게 되어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며 A씨를 검진한 당직의사 B씨와 해당 병원 측에 1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